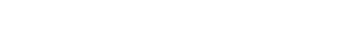유리잔의 탄생과 최적의 관리법

현대인들에게 맥주잔을 떠올려보라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유리잔을 떠올리지만, 이는 고작 1800년대 이후에야 처음 생겨난 인식이다. 맥주는 6000년 전부터 만들어져 왔으며, 과거엔 그 시절 나름의 맥주잔이 존재 했다. 과거의 맥주잔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해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맥주잔을 제대로 관리하고,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이번 ‘Keep Calm & Learn Craft’에선 맥주 잔의 역사, 잔 관리법, 깨끗한 잔을 판별하는 법 등 저번 편에서 미처 하지 못한 잔 이야기를 해보겠다.
맥주잔의 역사
The history of a beer glass
인류가 맥주가 본격적으로 양조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수메르 (Sumer) 문명부터였다. 유적과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맥주를 마실 땐 개인마다 잔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큰 항아리(Urn)에 맥주가 제공되었고, 수메르인들은 그 주변에 둘러앉아 빨대를 통해 항아리 속의 맥주를 마셨다고 전해진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맥주 문화는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에 따라 맥주잔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나무, 가죽, 토기 등을 비롯하여 백랍(Pewter), 청동, 도자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죽으로 만든 영국의 잭(Jack)이나 봄바드(Bombard), 나무로 만든 핀란드의 샤티하리 카(Sahtihaarikka)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켈트족이나 게르만족을 떠올릴 때 연상하는 속이 빈 소뿔 역시 당시의 맥주잔이라 할 수 있겠다. 1500년대부턴 유리잔도 만들어졌으나, 당시엔 유리가 귀했던 데다 일일이 입으로 불어가며 섬세한 작업을 통해 만들어야 했으므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맥주 전용 잔’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독일의 슈타인(Stein) 잔이다. ‘슈타인’은 독일어로 돌(Stone)을 의 미하는데, 석기(Stoneware)로 만든 잔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전까지 독일에선 거대한 공용 토기 그릇(Pitcher)에 맥주를 담아 놓고 돌아가며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펍을 찾는 단골손님들이 개인 별 잔을 제공받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크기가 작은 석기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슈타인 잔의 기원이다. 19세기에 들어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 위생적인 개별 잔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고, 본격적으로 슈타인 잔이 독일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된다. 참고로 슈타인 잔에 뚜껑이 달려있는 이유는 위생을 위해 곤충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 디자인도 멋지고 위생에도 좋은 슈타인 잔이 널리 퍼짐에 따라 바바리아 지역에선 1809년부터 1811년에 걸쳐 슈타인 잔 의 크기를 정확하게 1mass(약 1.069L)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1870년대에 바바리아 지역이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에 속하게 된 뒤로, 독일 전역에서 슈타인 잔의 크기는 1L로 정해졌다. 크기가 모두 같아진 슈타인 잔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브루어리들은 자신의 로고를 박은 저렴한 슈타인 잔을 마케팅을 위해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맥주 전용 잔’ 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다. 한데 독일 이외의 나라에선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825년, 미국 발명가인 John P. Bakewell은 가압 성형 유리 (Pressed Glass, 거푸집에 압력을 가해 제조하는 유리 제품)를 고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과는 달리 빠르게 유리 제품을 찍어내고 유리 잔을 저렴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사람들은 드디어 맥주의 색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맥주 양조장 역시 맥주의 색에 신경쓰게 된다. 이후 맥아 건조 기술이 발달하며 호박색 라거인 메르첸이 1841년 독일의 스파텐(Spaten)에서 탄생했고, 뒤이어 1842년에 최초의 황금색 라거인 필스너 우르켈이 등장한다. 아다시피 이 맥주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이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밝은색 맥주 열풍이 일었다. 그리고 1878년, 독일의 Lorenz Enzinger에 의해 맥
.jpg)
주 필터가 최초로 개발된다. 맥주의 자태가 더욱 밝고 깔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맥주의 외관을 즐기고자 하게 되었고, 이러한 여러 조건이 들어맞은 탓에 브루어리들은 회사 로고를 박은 투명한 유리 맥주잔을 대량생산하게 된다. 덕분에 유리 맥주잔은 유럽 전역에 걸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반대로 슈타인 잔처럼 불투명한 잔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맥주 잔이 유리잔이라는 지금의 개념은 이때부터 생겨났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리 맥주잔은 필스너, 머그, 고블릿 과 성배 위주였다. 이후 브루어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저마다 독창적인 형태로 맥주잔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중엔 플루트, 튤립, 슈탕에, 스니프터, 노닉 파인트 등과 같이 편의성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널리 쓰이게 된 맥주잔도 있고, 금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형태의 맥주잔도 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잔은 이렇듯 100여년 정도의 경쟁 끝에 살아남은 것이다.

맥주잔의 관리와 검사
The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beer glass잔은 내용물에 직접 닿는 용기인 만큼 맥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고로 맥주잔은 맥주의 외관이나 풍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깨끗한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잘 관리되어 깨끗한 상태의 맥주잔을 두고 ‘Beer Clean’이라고 표현하며, ‘Beer Clean’한 맥주잔을 위해선 세척과 건조, 보관과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잔은 사용하고 난 후 맥주 성분이 마르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세척은 부드러운 스펀지나 브러시, 적합한 세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때 세제는 기름 성분이 적거나 없는,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나지 않는 세제가 좋다. 이미 기름 성분이 많이 묻어있는 잔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애초에 맥주 잔을 다른 음식용 설거지와 잘 분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잔여 기름 성분은 맥주의 거품 생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맥주 전문점이라면 전용 세제를 따로 구해보는 것이 좋다.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것도 꽤나 효과적이다. 또한 스펀지나 브러시는 맥주잔 세척 용도로만 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손자국이나 립스틱, 맥주의 잔여 물질이나 이물질 등이 남아있진 않는지 확인하며 구석구석 세척해야 하며, 세척이 끝나면 잔여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헹궈야 한다. 더욱 깐깐하게 잔 관리를 하고 싶다면 30도 이상의 따뜻한 물과 살균제를 이용하여 살균까지 해주는 것이 좋다.
세척이 끝난 잔은 올바르게 건조해야 한다. 될 수 있는한 자연 건조하는 편이 좋다. 잔 내부까지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선반 위에 잔을 올려두고 건조해야 하며, 수건이나 고무판처럼 내부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잔을 건조해선 안된다. 물에 젖은 수건 등에서 비롯되는 냄새가 잔에 배기 때문이다. 린넨 등을 이용하여 잔 내부를 닦는 것도 안된다. 잔 내부를 닦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잔에서 물비린내가 날테니 말이다. 이때 건조는 반드시 연기나 다른 냄새가 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엔 먼지가 달라붙거나 냄새가 배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음식과 분리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 냉장고에 잔을 넣고 보관한다. 잔을 차게 보관하되, 절대로 얼려선 안된다. 물때나 잔여 세제 등의 성분이 자연스럽게 승화되지 않고 그대로 잔 벽에 붙어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후에 맥주를 따르면서도 살얼음이 생기는등, 맥주의 품질과 맛이 변화하게 된다. 가벼운 페일 라거를 마시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크래프트 맥주엔 결코 좋지않다. 맥주잔을 차게 보관하는 것과 얼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척하고 난 잔이 정말로 깨끗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는 맥주잔을 물에 담가보는 것이다. 잔 내부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담갔다가 거꾸로 잔을 들어 올리면 잔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이때 물이 잔 벽 전체를 감싸면서 부드럽게 흘러내린다면 ‘Beer Clean’한 유리잔이다. 잔 내부에 아직 남 아있는 이물질이 있다면 내부 코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물방울이 맺히기 쉽다. 린서(Rinser)를 사용하는 펍이라면 맥주를 따르기 전, 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소금이나 설탕을 이용하는 것이다. 잔 내부를 물로 헹군 뒤,
.jpg)
소금이나 설탕을 뿌리면 깨끗한 곳에는 잘 달라붙는다. 하지만 잔여 기름 등이 남아있는 더러운 부분엔 달라붙지 않는다. 즉 소금을 뿌렸을 때 잔 내부에 일정하게 잘 달라붙어 있다면, ‘Beer Clean’한 잔인 것이다.
세 번째는 마시면서 ‘레이싱(Lacing)’을 확인하는 것이다. ‘레이싱’은 잔 벽에 레이스(Lace)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현상을 칭하는 말로, 국내에선 아사히 사의 광고로 인해 ‘엔젤링’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마치 좋은 맥주의 증거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 ‘레이싱’은 잔이 깨끗할 때만 생기는 현상이며, 맥주의 품질과는 상관이 없다. 잔이 ‘Beer Clean’하다면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아름다운 레이싱이 생겨난다. 반면 잔이 더럽다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무늬가 생기거나, 아예 무늬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태생적으로 ‘레이싱’이 잘 생기지 않는 맥주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